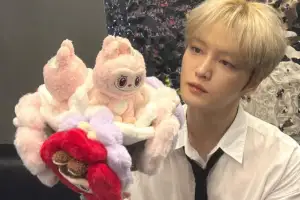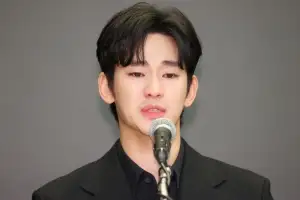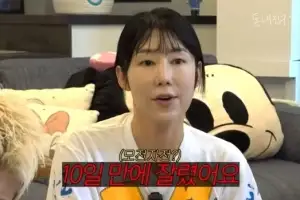мІңмһ¬нҷ”к°Җ л№Ҳм„јнҠё л°ҳ кі нқҗмқҳ вҖҳл°Өмқҳ н•ҳм–Җ집вҖҷ. к·ёмқҳ к·ёлҰјм—җлҠ” мң лҸ… лі„мқҙ л§Һмқҙ л“ұмһҘн•ңлӢӨ. лҜёкөӯмқҳ мІңл¬ён•ҷмһҗ лҸ„л„җл“ң мҡёмҠЁ н…ҚмӮ¬мҠӨлҢҖ көҗмҲҳлҠ” м–ҙлҠҗлӮ вҖҳм Җ лі„л“Өмқҳ мң„м№ҳк°Җ м •нҷ•н• к№Ң.вҖҷлқјлҠ” мқҳл¬ёмқ„ к°ҖмЎҢлӢӨ. к·ё нӣ„ к·ёлҰјмқ„ к·ёлҰ° н”„лһ‘мҠӨ мҳӨлІ лҘҙ м§Җм—ӯмқҳ 5000м—¬ к°Җкө¬ к°ҖмҡҙлҚ° кі нқҗмқҳ к·ёлҰјм—җ лӮҳмҳӨлҠ” 집과 лҳ‘к°ҷмқҖ н•ҳм–Җ 집мқ„ м°ҫм•„лғҲлӢӨ. м»ҙн“Ён„° мӢң뮬л Ҳмқҙм…ҳ л“ұмқ„ кұ°міҗ кі нқҗлҠ” 1890л…„ 6мӣ” 16мқј м Җл…Ғ 7мӢң кёҲм„ұмқҙ л°ҳм§қмқҙлҚҳ л°Өн•ҳлҠҳ м•„лһҳм—җм„ң н•ҳм–Җ 집мқ„ к·ёл ӨлғҲлӢӨлҠ” мӮ¬мӢӨмқ„ л°қнҳҖлғҲлӢӨ. мҡёмҠЁмқҖ к·ёлҰјмқ„ мң„н•ң мҳҲмҲ к°Җмқҳ м„ёмӢ¬н•ң кҙҖм°°л Ҙкіј м •нҷ•н•ң н‘ңнҳ„м—җ к°җнғ„н–ҲлӢӨкі н•ңлӢӨ.
лӘ…нҷ” мҶҚм—җ мһҗмЈј н‘ңнҳ„лҗҳлҠ” лі„кіј лӢ¬. л°Өн•ҳлҠҳмқҳ мғҒ징м—җ лЁёл¬јм§Җ м•Ҡкі лӘ…нҷ”мқҳ мҲҳмҲҳк»ҳлҒјлҘј н‘ёлҠ” лӢЁмҙҲк°Җ лҗңлӢӨ. м–ём ңл¶Җн„°мқёк°Җ кіјн•ҷмңјлЎң лӘ…нҷ”мқҳ мҲЁкІЁм§„ 진мӢӨмқ„ нҢҢн—Өм№ҳлҠ” м§ҖлӮңн•ң мһ‘м—…л“Өмқҙ 진н–үлҗҳкі мһҲлӢӨ. кіјн•ҷмқҳ нһҳмқ„ л№Ңл Ө лӘ…нҷ”лҠ” лЁј нӣ—лӮ лі‘л“ нҷ”к°Җмқҳ м–ҙл‘җмҡҙ мӮ¶мқ„ м•Ңл Ө мЈјкё°лҸ„ н•ңлӢӨ. лІ мқјм—җ мӢёмҳҖлҚҳ к·ё мӢңлҢҖмқҳ мғқнҷңмқ„ мҶҢмғҒнһҲ 비춰 мЈјкё°лҸ„ н•ңлӢӨ. мөңк·ј мЎ°м„ мӢңлҢҖ мөңкі мқҳ нҷ”к°Җмқҙм§Җл§Ң лі„лЎң м•Ңл Ө진 кІғмқҙ м—ҶлҠ” мӢ мңӨліөмқҳ лҜёмҠӨн„°лҰ¬н•ң к·ёлҰј вҖҳмӣ”н•ҳм •мқёвҖҷ(жңҲдёӢжғ…дәә)мқҳ мқҳл¬ёлҸ„ н’Җл ёлӢӨкі н•ңлӢӨ. м—ҙмҮ лҠ” лӢӨлҰ„м•„лӢҢ к·ёлҰј мҶҚмқҳ лӢ¬мқҙм—ҲлӢӨ. мІңл¬ён•ҷмһҗмқё мқҙнғңнҳ• 충лӮЁлҢҖ кІёмһ„көҗмҲҳлҠ” лӢ¬мқҳ лӘЁм–‘ л“ұмқ„ нҶөн•ҙ лӢ¬л°Өмқҳ м—°мқёмқ„ к·ёлҰ° лӮ мқҙ 1793л…„ 8мӣ” 21мқјмқҙлқјлҠ” мӮ¬мӢӨмқ„ м°ҫм•„лӮё кІғмқҙлӢӨ.
кі нқҗмқҳ л¶Ҳнӣ„ лӘ…мһ‘ вҖҳн•ҙл°”лқјкё°вҖҷ вҖҳл°Өмқҳ м№ҙнҺҳвҖҷ л“ұмқҙ мҳЁнҶө л…ёлһ‘мғүмңјлЎң кҝҲнӢҖкұ°лҰ° мқҙмң к°Җ л”°лЎң мһҲлӢӨкі н•ңлӢӨ. мӢёкө¬л Ө мҲ вҖҳм••мғқнҠёвҖҷмқ„ мҰҗкІЁ нҷ©мӢңмҰқ(й»ғиҰ–з—Ү)м—җ кұёл ёкё° л•Ңл¬ёмқҙлһҖлӢӨ. лІ•мқҳн•ҷмһҗ л¬ёкөӯ진 л°•мӮ¬лҠ” мқҳн•ҷмқҳ нһҳмқ„ л№Ңл Ө лӘ…нҷ”мқҳ мҲҳмҲҳк»ҳлҒјлҘј н’Җм–ҙлӮё кІғмңјлЎң мң лӘ…н•ҳлӢӨ. мқёмғҒнҢҢ нҷ”к°Җ лҘҙлҲ„м•„лҘҙк°Җ м җм°Ё лӘёл§Өк°Җ н’Қл§Ңн•ң м—¬м„ұмқ„ к·ёлҰ° кІғмқҖ лҘҳлЁёнӢ°мҰҳ л•Ңл¬ёмқҙлқјкі лҙӨлӢӨ.
лӘЁл”ңлҰ¬м•„лӢҲк°Җ лӘ©мқҙ мӮ¬мҠҙліҙлӢӨ кё°лӢӨлһҖ м—¬мқёмқ„ мЈјлЎң к·ёл ёлҚҳ кІғлҸ„ мӢ¬н•ң лӮңмӢңмҰқмқҙ мӣҗмқёмқҙлһҖлӢӨ. л°ңл Ҳн•ҳлҠ” м—¬мқёл“Өмқ„ мһҗмЈј к·ёл ёлҚҳ л“ңк°ҖлҸ„ вҖҳл°ңл ҲмӢңн—ҳвҖҷ л“ұм—җм„ң к·ёлҰјл“Өмқҳ мӨ‘мӢ¬л¶ҖлҘј м—¬л°ұмңјлЎң л‘җкі мЈјліҖм—җ мӮ¬л¬јмқ„ л°°м№ҳн•ң кІғлҸ„ мӢңл ҘмһҘм• мқҳ мӮ°л¬јмқҙлһҖлӢӨ.
мӢӨм ң нҷ”к°Җл“Ө мӨ‘м—җлҠ” кіјн•ҷмһҗмқё мқҙл“Өмқҙ м Ғм§Җ м•ҠлӢӨ. л ҲмҳӨлӮҳлҘҙлҸ„ лӢӨл№Ҳм№ҳлҘј н•„л‘җлЎң лҜёмјҲлһҖм ӨлЎң, н”јм№ҙмҶҢ л“ұмқҖ кјјкјјн•ң кҙҖм°°кіј м№ҳл°Җн•ң кіјн•ҷм Ғ кі„мӮ°мңјлЎң м—ӯмӮ¬м—җ кёёмқҙ лӮЁмқ„ лӘ…нҷ”лҘј м„ёмғҒм—җ лӮҙлҶ“м•ҳлӢӨ. мқҙл“ӨмқҖ нҷ”к°Җмқҙмһҗ кіјн•ҷмһҗмҳҖлҚҳ кІғмқҙлӢӨ. л№ӣм—җ мң лҸ… кҙҖмӢ¬мқҙ л§Һм•ҳлҚҳ мқёмғҒмЈјмқҳ м°ҪмӢңмһҗ лӘЁл„Өмқҳ к·ёлҰјлҸ„ л№ӣмқҳ нҡЁкіјлҘј кіјн•ҷм ҒмңјлЎң 추м Ғн•ң 집л…җмқҳ кІ°кіјмҳҖлӢӨкі н•ңлӢӨ. м„ңлЎң м–ҙмҡёлҰҙ кІғ к°ҷм§Җ м•ҠмқҖ лҜёмҲ кіј кіјн•ҷ. кІҪкі„мқҳ лІҪмқ„ н—Ҳл¬јкё°лҸ„ н•ҳкі мңөн•©н•ҳлӢҲ мҲЁкІЁм§„ 진мӢӨмқҙ лҚ” к°Җк№Ңмқҙ лӢӨк°ҖмҳЁлӢӨ.
мөңкҙ‘мҲҷ л…јм„Өмң„мӣҗ bori@seoul.co.kr
лӘ…нҷ” мҶҚм—җ мһҗмЈј н‘ңнҳ„лҗҳлҠ” лі„кіј лӢ¬. л°Өн•ҳлҠҳмқҳ мғҒ징м—җ лЁёл¬јм§Җ м•Ҡкі лӘ…нҷ”мқҳ мҲҳмҲҳк»ҳлҒјлҘј н‘ёлҠ” лӢЁмҙҲк°Җ лҗңлӢӨ. м–ём ңл¶Җн„°мқёк°Җ кіјн•ҷмңјлЎң лӘ…нҷ”мқҳ мҲЁкІЁм§„ 진мӢӨмқ„ нҢҢн—Өм№ҳлҠ” м§ҖлӮңн•ң мһ‘м—…л“Өмқҙ 진н–үлҗҳкі мһҲлӢӨ. кіјн•ҷмқҳ нһҳмқ„ л№Ңл Ө лӘ…нҷ”лҠ” лЁј нӣ—лӮ лі‘л“ нҷ”к°Җмқҳ м–ҙл‘җмҡҙ мӮ¶мқ„ м•Ңл Ө мЈјкё°лҸ„ н•ңлӢӨ. лІ мқјм—җ мӢёмҳҖлҚҳ к·ё мӢңлҢҖмқҳ мғқнҷңмқ„ мҶҢмғҒнһҲ 비춰 мЈјкё°лҸ„ н•ңлӢӨ. мөңк·ј мЎ°м„ мӢңлҢҖ мөңкі мқҳ нҷ”к°Җмқҙм§Җл§Ң лі„лЎң м•Ңл Ө진 кІғмқҙ м—ҶлҠ” мӢ мңӨліөмқҳ лҜёмҠӨн„°лҰ¬н•ң к·ёлҰј вҖҳмӣ”н•ҳм •мқёвҖҷ(жңҲдёӢжғ…дәә)мқҳ мқҳл¬ёлҸ„ н’Җл ёлӢӨкі н•ңлӢӨ. м—ҙмҮ лҠ” лӢӨлҰ„м•„лӢҢ к·ёлҰј мҶҚмқҳ лӢ¬мқҙм—ҲлӢӨ. мІңл¬ён•ҷмһҗмқё мқҙнғңнҳ• 충лӮЁлҢҖ кІёмһ„көҗмҲҳлҠ” лӢ¬мқҳ лӘЁм–‘ л“ұмқ„ нҶөн•ҙ лӢ¬л°Өмқҳ м—°мқёмқ„ к·ёлҰ° лӮ мқҙ 1793л…„ 8мӣ” 21мқјмқҙлқјлҠ” мӮ¬мӢӨмқ„ м°ҫм•„лӮё кІғмқҙлӢӨ.
кі нқҗмқҳ л¶Ҳнӣ„ лӘ…мһ‘ вҖҳн•ҙл°”лқјкё°вҖҷ вҖҳл°Өмқҳ м№ҙнҺҳвҖҷ л“ұмқҙ мҳЁнҶө л…ёлһ‘мғүмңјлЎң кҝҲнӢҖкұ°лҰ° мқҙмң к°Җ л”°лЎң мһҲлӢӨкі н•ңлӢӨ. мӢёкө¬л Ө мҲ вҖҳм••мғқнҠёвҖҷмқ„ мҰҗкІЁ нҷ©мӢңмҰқ(й»ғиҰ–з—Ү)м—җ кұёл ёкё° л•Ңл¬ёмқҙлһҖлӢӨ. лІ•мқҳн•ҷмһҗ л¬ёкөӯ진 л°•мӮ¬лҠ” мқҳн•ҷмқҳ нһҳмқ„ л№Ңл Ө лӘ…нҷ”мқҳ мҲҳмҲҳк»ҳлҒјлҘј н’Җм–ҙлӮё кІғмңјлЎң мң лӘ…н•ҳлӢӨ. мқёмғҒнҢҢ нҷ”к°Җ лҘҙлҲ„м•„лҘҙк°Җ м җм°Ё лӘёл§Өк°Җ н’Қл§Ңн•ң м—¬м„ұмқ„ к·ёлҰ° кІғмқҖ лҘҳлЁёнӢ°мҰҳ л•Ңл¬ёмқҙлқјкі лҙӨлӢӨ.
лӘЁл”ңлҰ¬м•„лӢҲк°Җ лӘ©мқҙ мӮ¬мҠҙліҙлӢӨ кё°лӢӨлһҖ м—¬мқёмқ„ мЈјлЎң к·ёл ёлҚҳ кІғлҸ„ мӢ¬н•ң лӮңмӢңмҰқмқҙ мӣҗмқёмқҙлһҖлӢӨ. л°ңл Ҳн•ҳлҠ” м—¬мқёл“Өмқ„ мһҗмЈј к·ёл ёлҚҳ л“ңк°ҖлҸ„ вҖҳл°ңл ҲмӢңн—ҳвҖҷ л“ұм—җм„ң к·ёлҰјл“Өмқҳ мӨ‘мӢ¬л¶ҖлҘј м—¬л°ұмңјлЎң л‘җкі мЈјліҖм—җ мӮ¬л¬јмқ„ л°°м№ҳн•ң кІғлҸ„ мӢңл ҘмһҘм• мқҳ мӮ°л¬јмқҙлһҖлӢӨ.
мӢӨм ң нҷ”к°Җл“Ө мӨ‘м—җлҠ” кіјн•ҷмһҗмқё мқҙл“Өмқҙ м Ғм§Җ м•ҠлӢӨ. л ҲмҳӨлӮҳлҘҙлҸ„ лӢӨл№Ҳм№ҳлҘј н•„л‘җлЎң лҜёмјҲлһҖм ӨлЎң, н”јм№ҙмҶҢ л“ұмқҖ кјјкјјн•ң кҙҖм°°кіј м№ҳл°Җн•ң кіјн•ҷм Ғ кі„мӮ°мңјлЎң м—ӯмӮ¬м—җ кёёмқҙ лӮЁмқ„ лӘ…нҷ”лҘј м„ёмғҒм—җ лӮҙлҶ“м•ҳлӢӨ. мқҙл“ӨмқҖ нҷ”к°Җмқҙмһҗ кіјн•ҷмһҗмҳҖлҚҳ кІғмқҙлӢӨ. л№ӣм—җ мң лҸ… кҙҖмӢ¬мқҙ л§Һм•ҳлҚҳ мқёмғҒмЈјмқҳ м°ҪмӢңмһҗ лӘЁл„Өмқҳ к·ёлҰјлҸ„ л№ӣмқҳ нҡЁкіјлҘј кіјн•ҷм ҒмңјлЎң 추м Ғн•ң 집л…җмқҳ кІ°кіјмҳҖлӢӨкі н•ңлӢӨ. м„ңлЎң м–ҙмҡёлҰҙ кІғ к°ҷм§Җ м•ҠмқҖ лҜёмҲ кіј кіјн•ҷ. кІҪкі„мқҳ лІҪмқ„ н—Ҳл¬јкё°лҸ„ н•ҳкі мңөн•©н•ҳлӢҲ мҲЁкІЁм§„ 진мӢӨмқҙ лҚ” к°Җк№Ңмқҙ лӢӨк°ҖмҳЁлӢӨ.
мөңкҙ‘мҲҷ л…јм„Өмң„мӣҗ bori@seoul.co.kr
2011-07-04 31л©ҙ
Copyright в“’ м„ңмҡёмӢ л¬ё All rights reserved. л¬ҙлӢЁ м „мһ¬-мһ¬л°°нҸ¬, AI н•ҷмҠө л°Ҹ нҷңмҡ© кёҲм§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