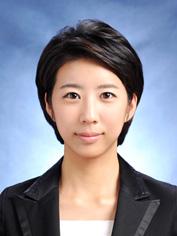
명희진 사회부 기자
발표 이후 서울대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인권센터의 후속조치를 취재하고자 여러 번 인권센터에 문의했지만 공석이거나 상담 중일 때가 잦았다. 어렵게 전화 연결이 된 센터장에게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후속조치를 알고 싶다.”고 요청했다. 전화기 건너편에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게 센터 망신을 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쓰시려고요. 당시 발표는 일부 사례인데 기자님은 이 사례가 서울대의 ‘일부’ 사례라고 쓰셨나요?” 대학 내 ‘일부’ 사례를 언론이 악의적으로 부풀렸다는 볼멘소리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는 교수들도 적지 않을 터, 이런 반응이 전혀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당시 조사에 응했던 대학원생은 1352명. 올 1학기 기준 서울대 대학원생 1만 2700명의 10% 선이다. 이 가운데 11.1%가 교수 가족의 일을 처리하는 등 비서처럼 개인적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답했다. 교수 개인을 위해 연구를 빼돌리라는 지시를 교수에게서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0.5%, 교수가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거나 자신의 논문을 대필시켰다고 답한 사람도 8.7%였다. 하지만 학위논문을 매개로 한 교수와 대학원생의 수직 관계를 감안하면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이들의 목소리는 10%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보내는 무언의 경고로 이해해야 한다.
대학교수는 지성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발표 이후 제보자를 찾겠다고 전화기를 이리저리 돌릴 게 아니라 학생 권리에 대해 더 고민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해야 하지 않겠나. 학생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만 행사하려 들 게 아니라 함께 연구하며 이끌어 주려는 지식탐구자의 모습이 아쉽기만 하다.
mhj46@seoul.co.kr
2012-11-02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