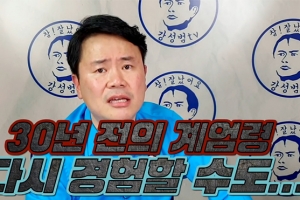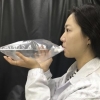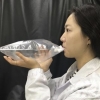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우리가 민심을 잘 대변한다고 믿는 정치체제는 민주정이다. 그런데 누가 그 민심을 대표하여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아테네인들이 민주정을 창안하고 실행하면서 맞닥뜨린 최고의 난제였다. 아테네 민주정의 성공과 좌절의 역사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정치학’(politika)에서 민심의 주체라는 인간의 지배를 경계했다. 그 대신 그는 탈인간적 통치자, 즉 법(nomoi)의 지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지배를 요구하는 자는 다름 아닌 신(theos)과 이성(nous)이 지배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지배를 요구하는 자는 거기에 야수적인 요소를 덧붙이는 것”이라고 준별했다.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격하의 의미는 아니다. 그는 인간이 욕망과 분노에 휘둘릴 때 야수적 행태에 빠지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욕망(epithymia)은 야수와도 같은 것이고 분노(thymos)는 통치자들과 가장 훌륭한 인간마저도 오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욕구(orexis)에서 해방된 이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적인 정의감과 분별력, 합리적 이성만이 다수의 민중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뒤틀린 ‘욕구에서 해방된 이성’, 즉 법이었다.
그가 “시민들 가운데 한 명이 지배하는 것보다 법이 지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여러 명이 통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도 그 여러 명은 법의 수호자 겸 하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다. 민중은 이성의 총화로 만들어진 법 아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어떤 야심가는 “촛불민심을 수용하여 촛불광장에서 야당의 대선 공동경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욕망’과 ‘분노’가 넘치는 광장의 민심, 즉 ‘인간의 지배’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라면 가능성 여부를 떠나 먼저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개탄하지 않을까.
광장의 민심이 법 위에 있다는 사고는 제자리를 지키는 ‘이성들’을 모독하는 위장 민주주의다. 대권에 눈이 먼 이들의 어처구니없는 선동에 더이상 현혹되지 말자.
2017-01-1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