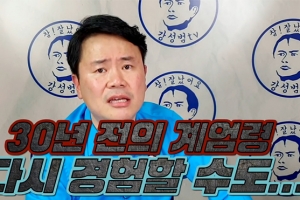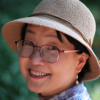성민정 중앙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특히 최근 한두 달간은 신문을 통해 새 소식을 접하면서도 뉴스 전달의 노고에 감사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비단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 보도가 그러했다.
한 달 내내 선거 관련 소식이 넘쳤던 4월은 예외로 하더라도, 지난 1~2주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과 사고 소식은 거의 매일 아침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주먹과 고성이 오가는 정치판의 폭력 사태나 일반인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액을 빼돌리고 밀항을 시도한 저축은행 오너 소식, 그리고 금융감독원 유리창에 매달려 눈물 흘리는 고령의 저축은행 피해자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며, 독자로서 참으로 긍정적 감정을 느끼기 어려운 소식들이다. 때로는 상쾌한 하루를 위해 차라리 신문을 펴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다.
조금은 세상의 다른 면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요즘, 서울신문의 몇 가지 기사는 굵직굵직한 사회 이슈들의 틈바구니에서 소소하게 신문의 가치와 역할에 고마움을 느끼게 해줬다.
메인 기사는 아니었지만 5월 7일 자 10면의 “광역버스 노선표 ‘너덜너덜’ 갈 곳 몰라 시민 ‘갈팡질팡’”은 일반 독자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잡아낸 그야말로 생활형 기사였다. 사실 일반인에게 훼손된 버스 노선표는 정치나 경제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당장의 문제이지만, 각종 주요 이슈에 밀려 묻히기 일쑤이다. 누군가에겐 별거 아닐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세상에 존재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찾아냄으로써 기대하지 않았지만 가려운 곳을 긁어준 존재감 있는 기사였다.
5월 15일 자 14면에 게재된 서울신문-서울시의회 공동 의정 모니터 결과를 보도한 “택시 문에 차량번호 등 정보 표시를” 역시 생활 이슈를 잘 잡아냄으로써 읽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였다.
조금은 덜 가벼운 주제를 다뤘으나, 충분히 그 존재감을 표출한 또 다른 기사는 5월 5일 자 커버스토리였다. 어린이날 행사나 선물 기사에 묻혀 축제 분위기 일색인 어린이날, 실종아동 가족의 슬픈 사연과 현황, 시스템 보완책과 예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취재는 꼭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니더라도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이슈 제기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특히 4면의 실종 예방법에 대한 기사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였다. 이런 ‘괜찮은’ 기사들을 읽고 나면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신문의 존재와 가치를 느끼게 된다.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에서 나아가 또 다른 언론의 기능은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자로서의 파수견(Watchdog)의 역할이다. 일반인의 처지에서 신문의 효용성은 거창한 정책 비판이나 복잡한 이슈 탐사와 같이 어쩐지 부담이 느껴지는 ‘감시’나 ‘고발’보다는 내 생활 속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고 해법을 찾아 주는 이러한 생활형 기사들에서 훨씬 크게 느껴진다.
최근 여러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와 조직, 언론사에서 자체적인 옴부즈맨 제도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차츰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서울신문에서 생활형 옴부즈맨 스타일 기사를 조금은 더 자주 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2-05-1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