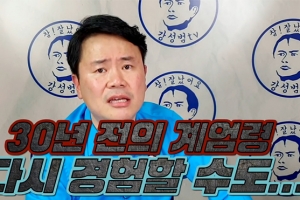9일(한국시간) 새벽 이탈리아 베니스 리도섬에서 막을 내린 제69회 베니스영화제의 스포트라이트는 오롯이 빛바랜 개량한복에 밑창 터진 신발, 꽁지머리를 한 아시아 감독에게 쏟아졌다. 2000년 ‘섬’으로 처음 베니스영화제(경쟁부문)를 두드릴 때만 해도 그는 철저한 무명이었다. 하층민의 삶에 대한 펄떡거리는 묘사, 인간의 악마성에 대한 탐닉에 일부 유럽평론가들은 일찌감치 매혹됐다. 반면 여성 비하로 페미니스트 진영의 공격을 자초했고, 신체 훼손으로 특징지어지는 폭력적인 표현 방식 탓에 혹평도 뒤따랐다. 하지만 스스로를 “열등감을 먹고 자란 괴물”이라고 평한 김기덕(52) 감독은 결국 황금사자상 트로피를 품었다.
한국 영화감독 중 그만큼 굴곡진 인생의 소유자도 드물다. 1960년 경북 봉화에서 절대군주와도 같던 6·25 상이용사 아버지와 외유내강형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구로공단과 청계천 공장에 들어갔다. 그의 최종학력은 ‘중졸’이다.
해병대에 입대해 5년 만에 하사관으로 제대했다. 시각장애인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1년쯤 신학을 공부했다.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감독은 “전도사가 되려고 공부했는데 끝내지는 못했다. (전도사는 아니지만)영화감독으로 모든 문제들을 깨달으려 노력한다.”고 털어놓았다. 종교적 배경은 작품에도 투영됐다. 이탈리아 평론가 안드레아 벨라비타는 ‘한국의 영화감독 7인을 말하다’에서 “기독교와 소통은 그의 지식과 정신적 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기독교로부터 어떤 종교적 확신도 얻지 못하지만, 죄와 속죄의 변증법만큼은 흡수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했다.
서른 살이 되던 1990년, 프랑스 파리로 훌쩍 떠났다. 초상화를 그리며 3년간 생계를 유지했다. 그 무렵 난생처음 본 영화 ‘양들의 침묵’, ‘퐁네프의 연인들’은 그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다. 1993년 한국에 돌아온 그는 영화진흥공사(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에 도전했다. 기계나 그림에는 능했지만, 글은 익숙한 표현수단이 아니었다. 떨어졌다. 오기가 생겨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교육원에 등록했다. 그러고는 1996년 3억 5000만원짜리 저예산 영화 ‘악어’로 데뷔했다. 영화를 처음 접한 지 불과 4년 만이다.
1998년 세 번째 작품 ‘파란 대문’이 베를린영화제 파노라마 부문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유럽에 이름을 알렸다. 2004년에는 ‘사마리아’로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빈집’으로 베니스영화제 감독상을 각각 받았다. 세계 3대 영화제의 감독상 트로피 2개를 한 해에 받는 이례적인 성취에 전 세계 영화계는 그를 새롭게 조명했다. 하지만 해외의 뜨거운 호응과 달리 국내에서는 ‘콤플렉스를 품은 비주류 감독’, ‘저예산 예술영화 감독’의 이미지가 여전했다. 평단과 관객은 ‘지지’ 혹은 ‘안티’로 극명하게 갈렸다. 70만명을 동원한 ‘나쁜 남자’를 제외하면 1만명도 넘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8년은 김 감독에게 끔찍한 한해였다. ‘비몽’ 촬영 중 여배우 이나영이 사고로 죽을 뻔한 데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영화는 영화다’를 연출했던 애제자 장훈 감독이 김기덕필름을 떠나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와 손잡았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은 그는 은둔생활에 돌입했다. 3년 동안 산속에 칩거하며 영화감독으로,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번뇌를 담은 셀프 다큐멘터리 ‘아리랑’을 찍었다. 장 감독과 충무로에 대한 독설을 담아 파문이 일었지만, 지난해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을 받았다. 영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는 덕분에 창작에 대한 열정을 회복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한국 영화감독 중 그만큼 굴곡진 인생의 소유자도 드물다. 1960년 경북 봉화에서 절대군주와도 같던 6·25 상이용사 아버지와 외유내강형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 구로공단과 청계천 공장에 들어갔다. 그의 최종학력은 ‘중졸’이다.
해병대에 입대해 5년 만에 하사관으로 제대했다. 시각장애인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1년쯤 신학을 공부했다.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김 감독은 “전도사가 되려고 공부했는데 끝내지는 못했다. (전도사는 아니지만)영화감독으로 모든 문제들을 깨달으려 노력한다.”고 털어놓았다. 종교적 배경은 작품에도 투영됐다. 이탈리아 평론가 안드레아 벨라비타는 ‘한국의 영화감독 7인을 말하다’에서 “기독교와 소통은 그의 지식과 정신적 성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기독교로부터 어떤 종교적 확신도 얻지 못하지만, 죄와 속죄의 변증법만큼은 흡수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했다.
서른 살이 되던 1990년, 프랑스 파리로 훌쩍 떠났다. 초상화를 그리며 3년간 생계를 유지했다. 그 무렵 난생처음 본 영화 ‘양들의 침묵’, ‘퐁네프의 연인들’은 그에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었다. 1993년 한국에 돌아온 그는 영화진흥공사(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에 도전했다. 기계나 그림에는 능했지만, 글은 익숙한 표현수단이 아니었다. 떨어졌다. 오기가 생겨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교육원에 등록했다. 그러고는 1996년 3억 5000만원짜리 저예산 영화 ‘악어’로 데뷔했다. 영화를 처음 접한 지 불과 4년 만이다.
1998년 세 번째 작품 ‘파란 대문’이 베를린영화제 파노라마 부문 개막작으로 상영되면서 유럽에 이름을 알렸다. 2004년에는 ‘사마리아’로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을, ‘빈집’으로 베니스영화제 감독상을 각각 받았다. 세계 3대 영화제의 감독상 트로피 2개를 한 해에 받는 이례적인 성취에 전 세계 영화계는 그를 새롭게 조명했다. 하지만 해외의 뜨거운 호응과 달리 국내에서는 ‘콤플렉스를 품은 비주류 감독’, ‘저예산 예술영화 감독’의 이미지가 여전했다. 평단과 관객은 ‘지지’ 혹은 ‘안티’로 극명하게 갈렸다. 70만명을 동원한 ‘나쁜 남자’를 제외하면 1만명도 넘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8년은 김 감독에게 끔찍한 한해였다. ‘비몽’ 촬영 중 여배우 이나영이 사고로 죽을 뻔한 데 충격을 받았다. 게다가 ‘영화는 영화다’를 연출했던 애제자 장훈 감독이 김기덕필름을 떠나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와 손잡았다. 속세와의 인연을 끊은 그는 은둔생활에 돌입했다. 3년 동안 산속에 칩거하며 영화감독으로,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번뇌를 담은 셀프 다큐멘터리 ‘아리랑’을 찍었다. 장 감독과 충무로에 대한 독설을 담아 파문이 일었지만, 지난해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을 받았다. 영화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는 덕분에 창작에 대한 열정을 회복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